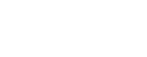보도자료
[고려방송] 광주 고려인마을 한글문학기획전, 잊혀진 교정원들의 헌신 조명
페이지 정보

본문
[고려방송] 광주 고려인마을 한글문학기획전, 잊혀진 교정원들의 헌신 조명
-낯선 땅에서도 지켜낸 언어혼, 교정원들의 손끝에서 살아난 한글
-새벽까지 활자와 씨름한 무명의 영웅들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주 고려인마을 고려인문화관(관장 김병학)에서 열리고 있는 ‘고려인 한글문학 기획전’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선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 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낯선 황무지에서 한글을 지켜낸 무명의 영웅들 ‘교정원(校正員)’ 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작가의 이름은 역사에 남는다. 그러나 글자 하나하나를 살려내고, 점 하나라도 흐트러지지 않게 붙잡아낸 이들의 이름은 잘 남지 않는다. 그들은 바로 교정원(校正員)들이었다.
교정원들의 하루는 늘 새벽으로 이어졌다. 신문 한 장, 문학집 한 권을 내기 위해 활자들을 정리하고, 오탈자를 찾아내며, 검열과 차별의 벽을 뚫고 한 줄 한 줄 지켜냈다. 그들에게는 언어가 곧 조국이었고, 글자는 사라져가는 민족을 이어주는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밤마다 어둑한 방에서 램프 불빛에 비친 활자들을 붙잡던 모습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을 잃지 않겠다”는 몸부림이었고, 후세를 향한 기도였다.
1937년 강제이주로 <선봉>이 사라졌을 때, 언어의 불씨는 꺼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듬해 카자흐스탄에서 다시 태어난 <레닌기치>는 고려인들의 언어혼을 되살렸다.
52년 동안 1만 1,878호. 시와 소설, 아동문학과 평론까지 수만 쪽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건, 교정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주옥(1919년생, 레니기치 기자), 정순희(1910년생, 1960-70년대 레닌기치 기자), 장인덕 (1911년생, 1960-70년대 레닌기치 기자), 박경란(1943년생, 레닌기치, 고려일보기자), 김춘순(1938-2005, 레닌기치, 고려일보 기자), 한올가(1947년생, 레닌기치, 고려일보 기자), 니조야 (1942-2014, 레닌기치, 고려일보기자), 이 외에도 한혜원, 김철수, 리정희, 남해봉 같은 인물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온다.
그들의 손끝에서 글자는 살아났고, 언어는 이어졌다. 활자에 새겨진 것은 단지 글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살아있다’는 외침이었다.
1990년 12월, 평론가 정상진이 ‘독자들과의 작별’을 남기며 <레닌기치>는 막을 내렸다. 그날은 고려인 한글문학의 종언이자, 교정원들의 손끝에서 지켜온 등불이 꺼지는 순간 같았다.
그러나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었다. 1991년, <고려일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신문은 이전만큼의 힘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한 글자도 잃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
우리는 종종 작가의 문장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마지막으로 그 문장을 붙잡고, 밤을 지새우며 교정지를 들여다본 이들의 얼굴은 잊기 쉽다.
이에 이번 기획전은 단순히 과거의 신문과 문학을 돌아보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곧, “한 글자도 잃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펜을 지키고, 활자를 다듬던 교정원들의 피땀 어린 기록을 되살리는 자리다.
그들의 손끝에서 태어난 글자들은 단순한 활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곧 고려인의 정체성과 언어혼이었으며, 세대를 건너 오늘 우리 앞에 선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다.
*사진 설명: 광주 고려인마을 한글문학기획전, 잊혀진 교정원들의 헌신 조명 / 사진 제공: 고려인마을
고려방송: 임용기 (고려인마을) 기자
-낯선 땅에서도 지켜낸 언어혼, 교정원들의 손끝에서 살아난 한글
-새벽까지 활자와 씨름한 무명의 영웅들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주 고려인마을 고려인문화관(관장 김병학)에서 열리고 있는 ‘고려인 한글문학 기획전’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선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 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낯선 황무지에서 한글을 지켜낸 무명의 영웅들 ‘교정원(校正員)’ 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작가의 이름은 역사에 남는다. 그러나 글자 하나하나를 살려내고, 점 하나라도 흐트러지지 않게 붙잡아낸 이들의 이름은 잘 남지 않는다. 그들은 바로 교정원(校正員)들이었다.
교정원들의 하루는 늘 새벽으로 이어졌다. 신문 한 장, 문학집 한 권을 내기 위해 활자들을 정리하고, 오탈자를 찾아내며, 검열과 차별의 벽을 뚫고 한 줄 한 줄 지켜냈다. 그들에게는 언어가 곧 조국이었고, 글자는 사라져가는 민족을 이어주는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밤마다 어둑한 방에서 램프 불빛에 비친 활자들을 붙잡던 모습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을 잃지 않겠다”는 몸부림이었고, 후세를 향한 기도였다.
1937년 강제이주로 <선봉>이 사라졌을 때, 언어의 불씨는 꺼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듬해 카자흐스탄에서 다시 태어난 <레닌기치>는 고려인들의 언어혼을 되살렸다.
52년 동안 1만 1,878호. 시와 소설, 아동문학과 평론까지 수만 쪽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건, 교정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주옥(1919년생, 레니기치 기자), 정순희(1910년생, 1960-70년대 레닌기치 기자), 장인덕 (1911년생, 1960-70년대 레닌기치 기자), 박경란(1943년생, 레닌기치, 고려일보기자), 김춘순(1938-2005, 레닌기치, 고려일보 기자), 한올가(1947년생, 레닌기치, 고려일보 기자), 니조야 (1942-2014, 레닌기치, 고려일보기자), 이 외에도 한혜원, 김철수, 리정희, 남해봉 같은 인물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온다.
그들의 손끝에서 글자는 살아났고, 언어는 이어졌다. 활자에 새겨진 것은 단지 글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살아있다’는 외침이었다.
1990년 12월, 평론가 정상진이 ‘독자들과의 작별’을 남기며 <레닌기치>는 막을 내렸다. 그날은 고려인 한글문학의 종언이자, 교정원들의 손끝에서 지켜온 등불이 꺼지는 순간 같았다.
그러나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었다. 1991년, <고려일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신문은 이전만큼의 힘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한 글자도 잃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
우리는 종종 작가의 문장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마지막으로 그 문장을 붙잡고, 밤을 지새우며 교정지를 들여다본 이들의 얼굴은 잊기 쉽다.
이에 이번 기획전은 단순히 과거의 신문과 문학을 돌아보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곧, “한 글자도 잃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펜을 지키고, 활자를 다듬던 교정원들의 피땀 어린 기록을 되살리는 자리다.
그들의 손끝에서 태어난 글자들은 단순한 활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곧 고려인의 정체성과 언어혼이었으며, 세대를 건너 오늘 우리 앞에 선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다.
*사진 설명: 광주 고려인마을 한글문학기획전, 잊혀진 교정원들의 헌신 조명 / 사진 제공: 고려인마을
고려방송: 임용기 (고려인마을) 기자
- 이전글[경향신문] 사라지는 기억을 붙드는 사람들···역사의 빛을 켜다 [광복80주년 기획] 25.08.27
- 다음글[고려방송] 광주고려인마을 한글문학기획전, 고려인 화가들의 발자취 25.08.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